대학 시절, 동네 본당 신부님이 양로원을 돌며 함께 예전 찬송가를 연주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실에 있는 오래되고 음이 맞지 않는 피아노로 저는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다」, 「오래된 나무 십자가」 같은 찬송가를 두드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양로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잠시 눈을 붙였고, 어떤 분들은 나지막이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훗날 본당 사제로 서품을 받은 뒤에도,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성체성사를 집전하며 여전히 기도서와 반주 사이를 오가며 「주여 매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하네」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필요로 했던 걸까요?
저는 항상 이 음악적 역할을 부끄럽게 떠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 음악 교육에 정서적,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셨지만, 대학에 들어가 저는 큰 갈등 끝에 다른 진로를 택했습니다. 이 결정을 후회하기란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이제 은퇴 시기를 맞이한 제 친구들 중에도, 의사나 학자, 단체의 지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많지만, 과거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 음이 어긋난 찬송가를 연주했다는 자책감이나 실망감을 위안 삼으려, 저는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라는 도덕적 자기합리화로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주의 크심을 찬양하네」나 「나를 축복의 통로로」와 같은 곡들을 연주하는 것은 적어도 세속적 영달을 좇는 전문 음악인의 길보다는 훨씬 더 의로워 보이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노인이나 버림받은 이들,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은 그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존엄을 지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헛됨보다 가벼우니라”(시편 49:2; 62:9). 교회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이라는 원칙(1968년 메델린 회의에서 사용된 중요한 표현)은 타당한 명령일 수 있지만, 이는 계층 간 본질적 가치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선택’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거기에’ 존재하지만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난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옆에 있는 이들과 살아가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적 선택”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한 본능에 저항하도록 부름받은 금욕적 소명입니다. 이는 곧 ‘이웃’의 재발견입니다. 이웃이란 문자 그대로 “곁에 거주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우선적 선택은 “눈을 뜨고, 나누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 우리가 처한 곳 어디에서든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의 본질 중 일부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철학자 이반 일리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사회정책이나 심지어 교회정책도 아닌 ‘만남’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웃은 바로 우리가 혈육을 지닌 존재로서 만나는 이들이며, 어떤 기묘한 상황이나 계획되지 않은 만남, 단순한 공동체적 근접성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 자신을 내어주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그려온 거창한 비전들—경력, 성소, 투자, 계획들—은 이러한 운명의 실질적 만남 앞에서는 장식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만남들이 하느님 밭의 실제 토양이요, 하느님 건물의 기초입니다(1코린 3:9). 이웃은 곧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계속>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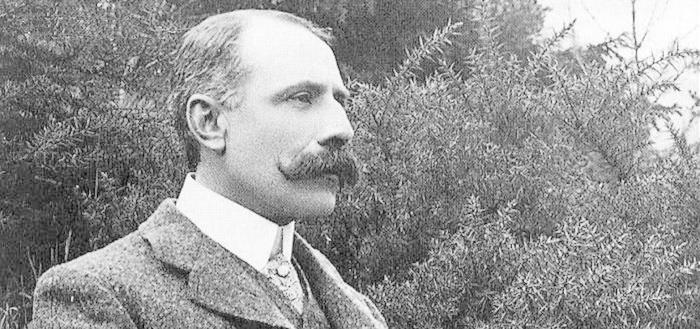 대학 시절, 동네 본당 신부님이 양로원을 돌며 함께 예전 찬송가를 연주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실에 있는 오래되고 음이 맞지 않는 피아노로 저는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다」, 「오래된 나무 십자가」 같은 찬송가를 두드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양로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잠시 눈을 붙였고, 어떤 분들은 나지막이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훗날 본당 사제로 서품을 받은 뒤에도,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성체성사를 집전하며 여전히 기도서와 반주 사이를 오가며 「주여 매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하네」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필요로 했던 걸까요?저는 항상 이 음악적 역할을 부끄럽게 떠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 음악 교육에 정서적,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셨지만, 대학에 들어가 저는 큰 갈등 끝에 다른 진로를 택했습니다. 이 결정을 후회하기란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이제 은퇴 시기를 맞이한 제 친구들 중에도, 의사나 학자, 단체의 지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많지만, 과거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노인들을 위해 음이 어긋난 찬송가를 연주했다는 자책감이나 실망감을 위안 삼으려, 저는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라는 도덕적 자기합리화로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주의 크심을 찬양하네」나 「나를 축복의 통로로」와 같은 곡들을 연주하는 것은 적어도 세속적 영달을 좇는 전문 음악인의 길보다는 훨씬 더 의로워 보이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해왔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노인이나 버림받은 이들,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은 그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존엄을 지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헛됨보다 가벼우니라”(시편 49:2; 62:9). 교회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이라는 원칙(1968년 메델린 회의에서 사용된 중요한 표현)은 타당한 명령일 수 있지만, 이는 계층 간 본질적 가치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가난한 이들이 ‘선택’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거기에’ 존재하지만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난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옆에 있는 이들과 살아가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적 선택”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한 본능에 저항하도록 부름받은 금욕적 소명입니다. 이는 곧 ‘이웃’의 재발견입니다. 이웃이란 문자 그대로 “곁에 거주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우선적 선택은 “눈을 뜨고, 나누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 우리가 처한 곳 어디에서든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의 본질 중 일부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사회철학자 이반 일리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사회정책이나 심지어 교회정책도 아닌 ‘만남’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웃은 바로 우리가 혈육을 지닌 존재로서 만나는 이들이며, 어떤 기묘한 상황이나 계획되지 않은 만남, 단순한 공동체적 근접성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들입니다.그들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 자신을 내어주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그려온 거창한 비전들—경력, 성소, 투자, 계획들—은 이러한 운명의 실질적 만남 앞에서는 장식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만남들이 하느님 밭의 실제 토양이요, 하느님 건물의 기초입니다(1코린 3:9). 이웃은 곧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계속>*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대학 시절, 동네 본당 신부님이 양로원을 돌며 함께 예전 찬송가를 연주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실에 있는 오래되고 음이 맞지 않는 피아노로 저는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다」, 「오래된 나무 십자가」 같은 찬송가를 두드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양로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잠시 눈을 붙였고, 어떤 분들은 나지막이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훗날 본당 사제로 서품을 받은 뒤에도,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성체성사를 집전하며 여전히 기도서와 반주 사이를 오가며 「주여 매순간마다 당신이 필요하네」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필요로 했던 걸까요?저는 항상 이 음악적 역할을 부끄럽게 떠맡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 음악 교육에 정서적,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셨지만, 대학에 들어가 저는 큰 갈등 끝에 다른 진로를 택했습니다. 이 결정을 후회하기란 얼마나 쉬운 일인지요. 이제 은퇴 시기를 맞이한 제 친구들 중에도, 의사나 학자, 단체의 지도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많지만, 과거의 선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노인들을 위해 음이 어긋난 찬송가를 연주했다는 자책감이나 실망감을 위안 삼으려, 저는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라는 도덕적 자기합리화로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주의 크심을 찬양하네」나 「나를 축복의 통로로」와 같은 곡들을 연주하는 것은 적어도 세속적 영달을 좇는 전문 음악인의 길보다는 훨씬 더 의로워 보이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해왔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노인이나 버림받은 이들,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은 그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존엄을 지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헛됨보다 가벼우니라”(시편 49:2; 62:9). 교회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이라는 원칙(1968년 메델린 회의에서 사용된 중요한 표현)은 타당한 명령일 수 있지만, 이는 계층 간 본질적 가치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가난한 이들이 ‘선택’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거기에’ 존재하지만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난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옆에 있는 이들과 살아가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적 선택”은 이러한 인간의 나약한 본능에 저항하도록 부름받은 금욕적 소명입니다. 이는 곧 ‘이웃’의 재발견입니다. 이웃이란 문자 그대로 “곁에 거주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 우선적 선택은 “눈을 뜨고, 나누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든, 우리가 처한 곳 어디에서든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의 본질 중 일부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사회철학자 이반 일리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사회정책이나 심지어 교회정책도 아닌 ‘만남’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웃은 바로 우리가 혈육을 지닌 존재로서 만나는 이들이며, 어떤 기묘한 상황이나 계획되지 않은 만남, 단순한 공동체적 근접성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들입니다.그들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 자신을 내어주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그려온 거창한 비전들—경력, 성소, 투자, 계획들—은 이러한 운명의 실질적 만남 앞에서는 장식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만남들이 하느님 밭의 실제 토양이요, 하느님 건물의 기초입니다(1코린 3:9). 이웃은 곧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계속>*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