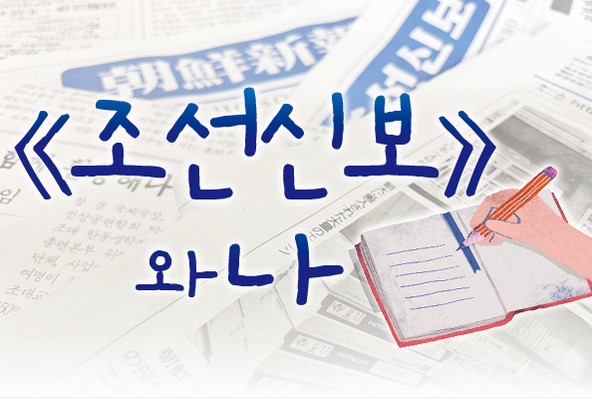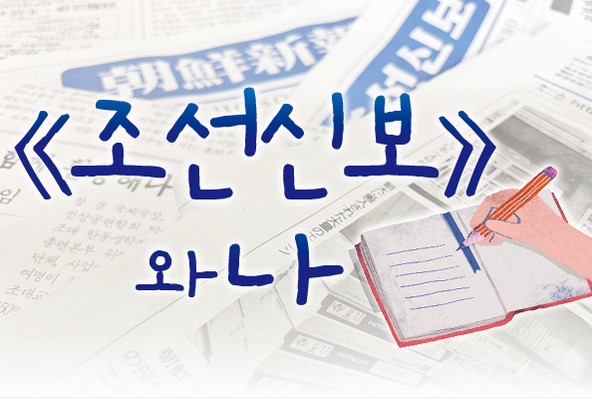 |
| 인터넷 캡쳐 - 조선신보 103 |
조선신보는 10월 6일자에서 “〈조선신보와 나〉 빛을 보게 된 소설의 번역데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한 전직 교원이 1987년 발표된 단편소설 《내 고향의 작은 다리》의 일본어 번역을 제자들과 함께 수행한 일화를 회상하며, 그 번역본이 2025년 신문 지면에 실리게 된 것을 “인생의 행운”으로 자축하는 내용이다. 표면상으로는 교육자의 감회와 문학에 대한 헌신을 다루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조선신보 특유의 체제적 충성 서사가 짙게 배어 있다.
기고자가 언급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런 젊은이들이 미국놈들과 싸웠다”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작품의 본질은 뚜렷하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문학이 아니라, 국가의 이념적 정당성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문학이다.
조선신보가 이 작품을 ‘조국해방 80돐’과 ‘신문 창간 80돐’의 상징으로 재소환한 이유는 명백하다.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항미투쟁’과 ‘세대 간 충성의 계승’을 선전하기 위한 선전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고자는 자신이 조선대학교 교육학부에서 학생들에게 번역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조선신보에 제공했다고 밝힌다. 이 과정을 “감사와 영광의 인연”으로 미화하지만, 실상은 문학교육이 학생들의 사고력 함양이 아닌 ‘이념 충성의 실습장’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수행한 번역이 ‘데타(원고)’로 활용되어 신문에 게재된 것은 학문적 과정이라기보다 체제 선전의 재료 제공에 가깝다. 그럼에도 기고문은 이 모든 것을 “교직생활의 완성”으로 찬미하며, 당의 문화정치가 교육현장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조선신보는 ‘조국해방 80돐’과 ‘신문 창간 80돐’을 맞아 문학 작품과 개인 회상을 결합시켜, 개인의 감정을 국가의 역사서사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감성적 동원을 시도한다.
“인생의 행운” “감회 깊은 역사적 시점”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체제 충성을 인간의 ‘감정적 보상’으로 포장하는 언어다. 이러한 감정 동원 전략은 체제 유지에 있어 ‘사상 사업’의 핵심이자, 문학이 정치의 하위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상징한다.
결국 이 기고문은 문학 작품의 미학적 가치나 교육적 의미를 탐구하는 글이 아니라, 조선신보가 스스로를 “친근한 우리 신문”으로 미화하며 충성의 기억을 재생산하는 자기찬양문이다.
교사의 추억, 학생들의 과제, 신문의 게재가 모두 “조국의 은덕”으로 귀결되는 이 구조 속에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성찰의 여지는 철저히 봉쇄된다.
조선신보가 진정으로 문화매체라면, 체제의 이념을 반복하는 ‘번역데타’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의 언어를 세상과 나누는 진정한 문학의 빛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김·성·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