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은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제3의 길(Third-wayism)’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길을 걷겠다고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그 반대자들은, 이른바 제3의 길이란 결국 언제나 왼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통찰력 있는 논쟁이 아니다. 흔히 그렇듯, 양측은 서로 진정한 합의는 커녕 진정한 불일치(disagreement)조차 이끌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같은 인식틀 안에서 사고하기 때문이다.
제3의 길을 공격하는 이들은 “좌·우”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권력의 도구로 활용한다. 그것은 동지들을 규합하고, 적들을 악마화하며,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이들을 조롱하거나 침묵시키는 편리한 무기다.
반면 제3의 길을 말하는 이는 스스로를 균형 잡힌 “이성의 목소리”로 포장하며, 양극단의 파괴적 잔해를 비웃는 성숙한 어른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3’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길”이란 오직 둘뿐인 길이 존재한다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의 정치 지형을 더 이상 좌우의 스펙트럼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버니 샌더스와 같은 구(舊)좌파는 최소한 ‘무언가를 위해’ 서 있다. 그들의 정치는 원칙적이고, 때로는 도덕주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
찰리 커크의 암살범으로 지목된 타일러 로빈슨이 온라인에서 만난 것은 이런 구좌파가 아니라 허무주의(nihilism)였다. 물론 허무주의는 옛 자유주의와 친연성이 있다. 세라핌 로즈 신부가 지적했듯, 그것은 “자율과 선택”을 절대화한 자유주의의 극단적 형태다. 인간이 “불편한 태아를 제거할 자유”를 주장하는 순간, 그는 이미 “무(無)”를 향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내의 구좌파들은 스스로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그나 안티파, 급진적 인종주의자 같은 허무주의자들을 ‘용병’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허무주의는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질서를 세우기보다 파괴에 몰두하며, 공공선을 남김없이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에 들끓는 우파적 허무주의자들 역시 적지 않다.
결국 ‘무(無)의 사람들’과 ‘어떤 것(Something)을 믿는 사람들’의 경계선은 좌우의 사이가 아니라, 양쪽 내부를 가로질러 존재한다. 좌파와 우파 모두 자신들이 불러들인 광기의 몫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좌우의 이분법은 정치적 판단력을 가린다. 오늘날 ‘좌파’로 분류되는 입장들을 보라. 무제한적 이민, 트랜스젠더리즘, 반인종차별 운동, 동성결혼, 반이스라엘·친팔레스타인 입장, 우크라이나 무조건 지지, 낙태권 옹호, 반트럼프주의 등이다. 이 항목들이 하나의 ‘좌파 패키지’로 묶이면서, 그중 단 하나라도 지지하면 곧바로 ‘좌파’로 낙인찍힌다.
만약 당신이 트럼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필자 역시 그렇다), 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겪은 불의에 공감하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민을 표현한다면, 즉시 ‘트랜스젠더 옹호자’나 ‘동성혼 지지자’로 분류될 것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리즘이나 동성혼과, 가자·우크라이나·인종문제에 대한 입장 사이에는 필연적 연결이 없다.
2015년까지만 해도, ‘보수’라 불리던 정치인들의 기본입장은 동시에 반(反)낙태적이며 친이민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레이건식 합의(Reaganism)’로의 회귀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미국 정치의 유동적 경계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가야 한다. 이때 가톨릭 사회 교리(Catholic Social Teaching) 는 탁월한 자원이 된다.
가톨릭 신자들은 단호히 낙태와 동성혼에 반대하면서도, 사회복지의 필요를 옹호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변호하며, 노동자의 존엄을 수호하고, 자본주의의 부패한 요소들을 비판한다.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민주당과 비슷하게 들릴 때가 있지만, 그 경향은 교리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리고 20세기의 인격주의자들(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을 따르는 이라면, 그의 정치는 미국식 좌우 도식에 결코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가톨릭 정치사상은 최선의 형태로, 2천 년에 걸친 교회적 성찰에서 길어 올린 원리에 근거한 대안적 정치학을 제시한다.
프로테스탄트 전통에도 사회적·정치적 가르침의 계보가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미국 보수주의의 변종이 아니다. 오늘날 그 가장 정교하고 깊이 있는 대표자는 올리버 오도노번(Oliver O’Donovan)이다. 그는 보수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정작 보수주의 자체를 신학적으로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민족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보편적 질서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며, 결국 자기 자신(혹은 민족, 사회)을 스스로의 목적(end in itself)으로 만들 위험에 빠진다. 그때 “사회 정체성의 보존이 곧 사회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정치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때,” 그것은 우상(idol)이 된다. 오도노번은 좌파의 입장도, 허공의 중도도 아닌, 기독교 정치 전통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보수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그 전통을 그보다 더 깊이 이해한 이는 거의 없다.
그리스도인은 신학적 이유에서라도 좌우의 이분법과 그 기생적 형태인 ‘제3의 길’을 거부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종종 예수를 입에 올리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실상 몸 없는 머리, 곧 어느 정당의 몸뚱이에나 붙일 수 있는 고립된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몸을 지닌 머리, 곧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예수”를 입으로 공경하면서 “그의 신부(Queen, 곧 교회)”를 모욕하는 정치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는, 세속 정치의 풍경을 보편적 친교(communio)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느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세상의 여러 도시들 속에서 하느님의 도성(Civitas Dei)임을 고백할 때, 정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교회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오도노번이 말하듯, “그리스도교 정치의 근본 물음은 오직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만 제기된다.” 즉, “이 시기, 이 방식으로 공공선을 수호하는 일이, 하느님의 나라라는 포괄적 정체성의 개인적·공동체적 선(common good)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정치 자체를 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이는 교회 밖에는 없기에, 그리스도교 정치는 그 본질상 언제나 ‘또 다른 길(another way)’을 말한다.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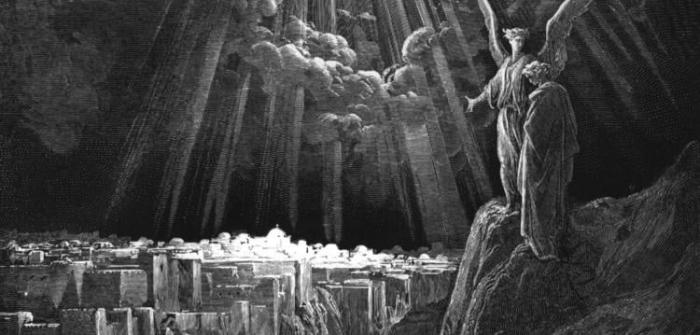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은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제3의 길(Third-wayism)’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좌파도 우파도 아닌 길을 걷겠다고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그 반대자들은, 이른바 제3의 길이란 결국 언제나 왼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라고 비판한다.그러나 이는 그렇게 통찰력 있는 논쟁이 아니다. 흔히 그렇듯, 양측은 서로 진정한 합의는 커녕 진정한 불일치(disagreement)조차 이끌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같은 인식틀 안에서 사고하기 때문이다.제3의 길을 공격하는 이들은 “좌·우”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권력의 도구로 활용한다. 그것은 동지들을 규합하고, 적들을 악마화하며,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이들을 조롱하거나 침묵시키는 편리한 무기다.반면 제3의 길을 말하는 이는 스스로를 균형 잡힌 “이성의 목소리”로 포장하며, 양극단의 파괴적 잔해를 비웃는 성숙한 어른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3’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길”이란 오직 둘뿐인 길이 존재한다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선택이기 때문이다.사실 오늘날의 정치 지형을 더 이상 좌우의 스펙트럼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버니 샌더스와 같은 구(舊)좌파는 최소한 ‘무언가를 위해’ 서 있다. 그들의 정치는 원칙적이고, 때로는 도덕주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찰리 커크의 암살범으로 지목된 타일러 로빈슨이 온라인에서 만난 것은 이런 구좌파가 아니라 허무주의(nihilism)였다. 물론 허무주의는 옛 자유주의와 친연성이 있다. 세라핌 로즈 신부가 지적했듯, 그것은 “자율과 선택”을 절대화한 자유주의의 극단적 형태다. 인간이 “불편한 태아를 제거할 자유”를 주장하는 순간, 그는 이미 “무(無)”를 향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게다가 민주당 내의 구좌파들은 스스로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그나 안티파, 급진적 인종주의자 같은 허무주의자들을 ‘용병’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허무주의는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질서를 세우기보다 파괴에 몰두하며, 공공선을 남김없이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에 들끓는 우파적 허무주의자들 역시 적지 않다.결국 ‘무(無)의 사람들’과 ‘어떤 것(Something)을 믿는 사람들’의 경계선은 좌우의 사이가 아니라, 양쪽 내부를 가로질러 존재한다. 좌파와 우파 모두 자신들이 불러들인 광기의 몫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좌우의 이분법은 정치적 판단력을 가린다. 오늘날 ‘좌파’로 분류되는 입장들을 보라. 무제한적 이민, 트랜스젠더리즘, 반인종차별 운동, 동성결혼, 반이스라엘·친팔레스타인 입장, 우크라이나 무조건 지지, 낙태권 옹호, 반트럼프주의 등이다. 이 항목들이 하나의 ‘좌파 패키지’로 묶이면서, 그중 단 하나라도 지지하면 곧바로 ‘좌파’로 낙인찍힌다.만약 당신이 트럼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필자 역시 그렇다), 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겪은 불의에 공감하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민을 표현한다면, 즉시 ‘트랜스젠더 옹호자’나 ‘동성혼 지지자’로 분류될 것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리즘이나 동성혼과, 가자·우크라이나·인종문제에 대한 입장 사이에는 필연적 연결이 없다.2015년까지만 해도, ‘보수’라 불리던 정치인들의 기본입장은 동시에 반(反)낙태적이며 친이민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레이건식 합의(Reaganism)’로의 회귀를 주장하지 않는다.)그리스도인들은 미국 정치의 유동적 경계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가야 한다. 이때 가톨릭 사회 교리(Catholic Social Teaching) 는 탁월한 자원이 된다.가톨릭 신자들은 단호히 낙태와 동성혼에 반대하면서도, 사회복지의 필요를 옹호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변호하며, 노동자의 존엄을 수호하고, 자본주의의 부패한 요소들을 비판한다.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민주당과 비슷하게 들릴 때가 있지만, 그 경향은 교리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리고 20세기의 인격주의자들(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을 따르는 이라면, 그의 정치는 미국식 좌우 도식에 결코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가톨릭 정치사상은 최선의 형태로, 2천 년에 걸친 교회적 성찰에서 길어 올린 원리에 근거한 대안적 정치학을 제시한다.프로테스탄트 전통에도 사회적·정치적 가르침의 계보가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미국 보수주의의 변종이 아니다. 오늘날 그 가장 정교하고 깊이 있는 대표자는 올리버 오도노번(Oliver O’Donovan)이다. 그는 보수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정작 보수주의 자체를 신학적으로 비판한다.그에 따르면 민족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보편적 질서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며, 결국 자기 자신(혹은 민족, 사회)을 스스로의 목적(end in itself)으로 만들 위험에 빠진다. 그때 “사회 정체성의 보존이 곧 사회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정치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때,” 그것은 우상(idol)이 된다. 오도노번은 좌파의 입장도, 허공의 중도도 아닌, 기독교 정치 전통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보수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그 전통을 그보다 더 깊이 이해한 이는 거의 없다.그리스도인은 신학적 이유에서라도 좌우의 이분법과 그 기생적 형태인 ‘제3의 길’을 거부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종종 예수를 입에 올리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실상 몸 없는 머리, 곧 어느 정당의 몸뚱이에나 붙일 수 있는 고립된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몸을 지닌 머리, 곧 교회의 머리이시다.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예수”를 입으로 공경하면서 “그의 신부(Queen, 곧 교회)”를 모욕하는 정치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는, 세속 정치의 풍경을 보편적 친교(communio)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느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세상의 여러 도시들 속에서 하느님의 도성(Civitas Dei)임을 고백할 때, 정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교회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오도노번이 말하듯, “그리스도교 정치의 근본 물음은 오직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만 제기된다.” 즉, “이 시기, 이 방식으로 공공선을 수호하는 일이, 하느님의 나라라는 포괄적 정체성의 개인적·공동체적 선(common good)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정치 자체를 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이는 교회 밖에는 없기에, 그리스도교 정치는 그 본질상 언제나 ‘또 다른 길(another way)’을 말한다.*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은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제3의 길(Third-wayism)’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좌파도 우파도 아닌 길을 걷겠다고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그 반대자들은, 이른바 제3의 길이란 결국 언제나 왼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라고 비판한다.그러나 이는 그렇게 통찰력 있는 논쟁이 아니다. 흔히 그렇듯, 양측은 서로 진정한 합의는 커녕 진정한 불일치(disagreement)조차 이끌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같은 인식틀 안에서 사고하기 때문이다.제3의 길을 공격하는 이들은 “좌·우”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권력의 도구로 활용한다. 그것은 동지들을 규합하고, 적들을 악마화하며,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이들을 조롱하거나 침묵시키는 편리한 무기다.반면 제3의 길을 말하는 이는 스스로를 균형 잡힌 “이성의 목소리”로 포장하며, 양극단의 파괴적 잔해를 비웃는 성숙한 어른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3’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다. “셋째 길”이란 오직 둘뿐인 길이 존재한다는 세계에서만 가능한 선택이기 때문이다.사실 오늘날의 정치 지형을 더 이상 좌우의 스펙트럼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버니 샌더스와 같은 구(舊)좌파는 최소한 ‘무언가를 위해’ 서 있다. 그들의 정치는 원칙적이고, 때로는 도덕주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찰리 커크의 암살범으로 지목된 타일러 로빈슨이 온라인에서 만난 것은 이런 구좌파가 아니라 허무주의(nihilism)였다. 물론 허무주의는 옛 자유주의와 친연성이 있다. 세라핌 로즈 신부가 지적했듯, 그것은 “자율과 선택”을 절대화한 자유주의의 극단적 형태다. 인간이 “불편한 태아를 제거할 자유”를 주장하는 순간, 그는 이미 “무(無)”를 향한 길에 들어선 것이다.게다가 민주당 내의 구좌파들은 스스로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그나 안티파, 급진적 인종주의자 같은 허무주의자들을 ‘용병’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허무주의는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질서를 세우기보다 파괴에 몰두하며, 공공선을 남김없이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에 들끓는 우파적 허무주의자들 역시 적지 않다.결국 ‘무(無)의 사람들’과 ‘어떤 것(Something)을 믿는 사람들’의 경계선은 좌우의 사이가 아니라, 양쪽 내부를 가로질러 존재한다. 좌파와 우파 모두 자신들이 불러들인 광기의 몫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좌우의 이분법은 정치적 판단력을 가린다. 오늘날 ‘좌파’로 분류되는 입장들을 보라. 무제한적 이민, 트랜스젠더리즘, 반인종차별 운동, 동성결혼, 반이스라엘·친팔레스타인 입장, 우크라이나 무조건 지지, 낙태권 옹호, 반트럼프주의 등이다. 이 항목들이 하나의 ‘좌파 패키지’로 묶이면서, 그중 단 하나라도 지지하면 곧바로 ‘좌파’로 낙인찍힌다.만약 당신이 트럼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필자 역시 그렇다), 그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겪은 불의에 공감하며,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민을 표현한다면, 즉시 ‘트랜스젠더 옹호자’나 ‘동성혼 지지자’로 분류될 것이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리즘이나 동성혼과, 가자·우크라이나·인종문제에 대한 입장 사이에는 필연적 연결이 없다.2015년까지만 해도, ‘보수’라 불리던 정치인들의 기본입장은 동시에 반(反)낙태적이며 친이민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분명히 말하지만, 필자는 ‘레이건식 합의(Reaganism)’로의 회귀를 주장하지 않는다.)그리스도인들은 미국 정치의 유동적 경계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가야 한다. 이때 가톨릭 사회 교리(Catholic Social Teaching) 는 탁월한 자원이 된다.가톨릭 신자들은 단호히 낙태와 동성혼에 반대하면서도, 사회복지의 필요를 옹호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변호하며, 노동자의 존엄을 수호하고, 자본주의의 부패한 요소들을 비판한다.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민주당과 비슷하게 들릴 때가 있지만, 그 경향은 교리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리고 20세기의 인격주의자들(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을 따르는 이라면, 그의 정치는 미국식 좌우 도식에 결코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가톨릭 정치사상은 최선의 형태로, 2천 년에 걸친 교회적 성찰에서 길어 올린 원리에 근거한 대안적 정치학을 제시한다.프로테스탄트 전통에도 사회적·정치적 가르침의 계보가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미국 보수주의의 변종이 아니다. 오늘날 그 가장 정교하고 깊이 있는 대표자는 올리버 오도노번(Oliver O’Donovan)이다. 그는 보수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정작 보수주의 자체를 신학적으로 비판한다.그에 따르면 민족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보편적 질서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며, 결국 자기 자신(혹은 민족, 사회)을 스스로의 목적(end in itself)으로 만들 위험에 빠진다. 그때 “사회 정체성의 보존이 곧 사회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정치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때,” 그것은 우상(idol)이 된다. 오도노번은 좌파의 입장도, 허공의 중도도 아닌, 기독교 정치 전통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보수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그 전통을 그보다 더 깊이 이해한 이는 거의 없다.그리스도인은 신학적 이유에서라도 좌우의 이분법과 그 기생적 형태인 ‘제3의 길’을 거부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종종 예수를 입에 올리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실상 몸 없는 머리, 곧 어느 정당의 몸뚱이에나 붙일 수 있는 고립된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몸을 지닌 머리, 곧 교회의 머리이시다.그리스도인은 “왕이신 예수”를 입으로 공경하면서 “그의 신부(Queen, 곧 교회)”를 모욕하는 정치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는, 세속 정치의 풍경을 보편적 친교(communio)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느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세상의 여러 도시들 속에서 하느님의 도성(Civitas Dei)임을 고백할 때, 정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교회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오도노번이 말하듯, “그리스도교 정치의 근본 물음은 오직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만 제기된다.” 즉, “이 시기, 이 방식으로 공공선을 수호하는 일이, 하느님의 나라라는 포괄적 정체성의 개인적·공동체적 선(common good)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 정치 자체를 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이는 교회 밖에는 없기에, 그리스도교 정치는 그 본질상 언제나 ‘또 다른 길(another way)’을 말한다.*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