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람객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 1 |
일본 도쿄에서 북한 인권실태를 다룬 ‘제7회 북한에 자유를! 인권영화제’가 열리며, 일본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의 장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영화제는 12월 5~6일, 도쿄 신주쿠구 이치가야에 있는 JICA 지구히로바(市ヶ谷ビル)에서 진행되었다. 주최는 ‘북한인권영화제 실행위원회’로, 위원장은 북한 귀국사업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해 온 사에키 히로아키(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 대표)가 맡고 있다. 입장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① “북한 귀국사업은 무엇이었는가”에서 시작하는 1일차
영화제 1일차(5일 금요일)는 11시 30분 개장, 12시 개회로 개막했다. 첫 세션 제목은 「북한 귀국사업은 무엇이었는가」로, 1959년부터 진행된 재일조선인·일본인 배우자 등의 ‘북송 사업’이 어떤 비극적 결과를 낳았는지 짚는 해설과 상영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상영작들은 다음과 같다.
「인질 93340」
한국 NGO THINK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로, ‘지상의 낙원’을 꿈꾸며 북한으로 떠난 가족을 일본에 남겨둔 채 살아온 이들의 목소리를 담담히 기록했다. 일본 주최 측 안내에 따르면 이번 상영은 일본 첫 공개이며, 재일 3세 활동가 박향수씨와 그의 어머니의 증언도 포함되었다.
「바다를 건너는 우정」(海を渡る友情)
귀국사업·탈북·분단으로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연대와 우정을 다룬 작품으로, 귀환자 문제를 감성적으로 풀어내었다.
「Return to Paradise」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제작한 2부작 다큐멘터리로, ‘지상낙원’ 선전에 이끌려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현실과, 왜 약 10만 명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떠났는지를 추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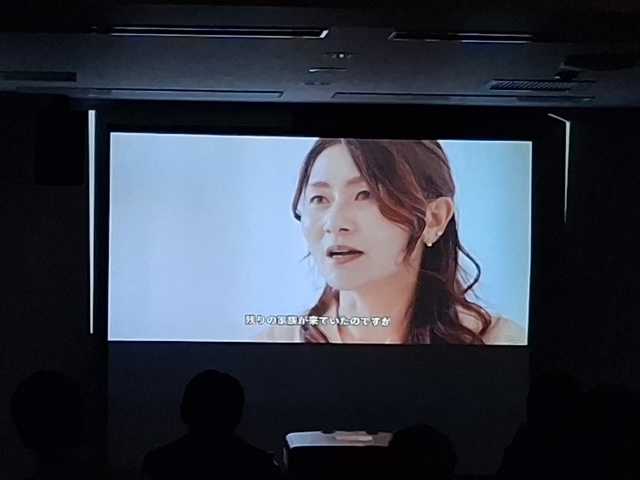 |
| 인권영화제 출품작 상영 모습 |
② 2일차, 탈북 청년 감독과 언론인의 시선으로 본 북한
2일차(6일 토요일)는 오전 9시 15분 개장, 9시 30분 개회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한층 더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다.
「죽어도 한류(死んでも韓流)」, 「임시 교원(臨時教員)」
두 작품은 젊은 탈북 청년 감독들이 연출한 영화로, 북한 청년과 교원, 일상 속 억압과 갈망을 현실감 있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안내문은 이 작품들을 “젊은 세대의 눈으로 본 북한 사회의 균열”로 소개하고 있다.
「위대한 선군조선의 어머니」(일부 상영)
북한 선전영상을 부분적으로 상영하며, 체제 이데올로기의 여성상·모성상이 어떻게 동원되고 왜곡되는지를 해설하는 시도가 병행된다.
「도쿄신문 편집위원 오미 요지(五味洋治)의 특강」
김정은의 생모로 알려진 고영희를 추적한 저서 『고영희 – “김정은의 어머니”가 된 재일 코리안』의 저자로, 북한 권력의 내밀한 구조와 재일 조선인 사회의 비극적 교차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신이 모르는 납치 문제」 상영 및 토크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특정실종자’ 문제를 다루며,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납치 의혹과 진상 규명 요구를 재확인하는 자리다. 이 작품은 납북 의심 실종자를 추적해온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참여해 제작한 영상으로, 영화제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③ 일본의 ‘북한인권주간’과 시민 영화제의 의미
일본 정부는 법률로 매년 12월 10~16일을 ‘북한인권침해 계발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납치·수용소·귀국사업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홍보·교육 캠페인을 전개한다. 영화제는 이러한 공식 일정과 보조를 맞추며, “정부 행사로는 담기 어려운 생생한 증언과 피해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민간 차원의 플랫폼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올해는 도쿄에서 7번째를 맞는 영화제와 더불어, 한국의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가 10월 도쿄 히비야 도서문화관에서 북한 인권 영화 상영회를 여는 등, 일본 내에서 복수의 북한인권 영화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탈북민 증언·단편 수상작 상영 등 다양한 형식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2019년을 끝으로 ‘북한인권영화제’가 사실상 중단된 반면, 일본에서는 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NGO들이 중심이 되어 영화제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재일교포 매체인 통일일보의 강창만 회장은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북한인권영화제는 오가와 교수와 사에키 히로아키, 야마다 후미아키 등 오랜 북한인권 운동가들의 집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④ ‘지상의 낙원’ 신화를 깨는 작은 스크린들
이번 영화제의 핵심 키워드는 귀국사업, 납치, 수용소, 탈북, 재일 코리안이다. 작품 대부분이 북한에 직접 들어갈 수 없기에, “남겨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북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우회적으로 증언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귀국선에 올라탄 이들의 선택이 어떻게 ‘편도행 지옥행 티켓’이 되었는지, 일본에 남겨진 가족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떤 죄책감과 상실 속에 살아왔는지, 탈북 청년과 교사가 본 북한의 현실이 체제 선전과 어떻게 다른지, 일본인 납치 피해자·특정실종자 문제가 왜 여전히 ‘진행형’인지를, 관객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드는 스크린 위의 이야기로 마주하게 된다.
관계자들은 이번 영화제를 두고 “망각과의 싸움”이라고 입을 모은다. 북한과의 수교도, 납치 문제의 완전한 해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억을 유지하고 기록을 축적하는 일 자체가 인권 운동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
| 관람객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 2 |
⑤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이번 도쿄 북한인권영화제는 일본 국내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도 여러 질문을 던진다.
먼저 한국의 북한 인권 담론은 왜 점점 좁아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정치적 진영 논쟁 속에서 인권 의제가 소모되는 사이, 영화제와 같은 시민 플랫폼은 점차 설 자리를 잃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정치와 분리된 인간의 이야기’로 듣는 공간을 한국은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재일교포, 귀국자, 납치 피해자라는 ‘경계인’들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는 얼마나 자기 문제로 수용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다.
도쿄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는 화려한 레드카펫도, 거대 스폰서도 없는 작은 행사다. 그러나 소규모 상영관에서 오가는 증언과 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조 속에서 잊혀져 온 개별 인간의 얼굴과 이름들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5일 열린 첫날 행사에서는 일본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아라키 가츠히로 대표, 영화제 실무책임을 맡은 재일교포 출신 송윤복 대표, 아시아자유민주연대 미우라 코타로 대표와 한국에서 온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 등이 조우하여 북한인권 국제연대의 의미를 새롭게 높였다.
도쿄의 작은 스크린 위에서, 북한 인권의 기록과 증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그 스크린을 얼마나 진지하게 응시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몫이다.
김·성·일 <취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