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미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방대한 문서 묶음 속에는, 이른바 ‘유명 인사들의 성매매 알선자’로 지목된 엡스타인이 2013년에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 묻혀 있다.
그 이메일에서 그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취하고 있는 자선 활동의 접근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엡스타인은 한 대화 상대에게 이렇게 불평한다.
“저 사람들은 더 나은 재단 구조와 목표를 생각해낼 수 없는 건가.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터무니없는 선언이나 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 10억 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1달러씩만 식량을 주면 될 것 아닌가. 매년 10억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건 가톨릭의 최악의 모습이다.”
이것을 일종의 ‘보증서’로 본다면, 교황청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바랄 수 없었을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빌 게이츠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 다만 그는 2014년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아이들을 종교적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아이들은 멀린다가 다니는 가톨릭 교회에 다녔고,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의 재단은 스스로를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에 따라 인도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분명 가톨릭 사회 교리를 떠올리게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2319항은 모든 인간 생명이 “살아 계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의지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가르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5년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인류를 “모두가 동일한 근본적 선, 곧 동등한 인격적 존엄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위대한 가족”이라고 묘사한다. 생명윤리 문제를 다룬 『생명의 기원과 존엄에 관한 훈령』에서, 당시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은 “인간 인격의 평등성, 존엄성, 그리고 근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경고했다.
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온 ‘imago Dei 하느님의 형상’, 곧 브체렘 엘로힘(b’tzelem Elohim)의 교리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가톨릭 신앙을 반영한다. 그리고 종종 잊히지만, 이 영적 유사성은 우리가 삶의 방식에서 하느님을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이는 소속되어 있으며, 누구도 다른 이보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다.
생명의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가톨릭을 오늘날 좌우 양쪽의 정치 윤리와 충돌하게 만든다. 진보 진영은 세계관을 ‘자율성의 극대화’라는 원리 위에 세운다. 그들에게 침해 불가능한 것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미덕·전통·사회적 관습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나 선호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며 살 권리다. 그래서 “내 몸은 내 선택”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자살은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죽음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재구성된다.
엡스타인이 지적했듯이, 가톨릭은 생명의 불가침성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보 개념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된다. 20세기 중반 이후 교회는 서구 중도좌파 정치에서 주변화되었고, 대중문화에서는 생명에 대한 헌신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는, 교회를 세속적 현대성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이미 오래전에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과 선택을 다시 통제하려 드는 ‘하지 말라’는 기관으로 각인시켰다.
생명 그 자체는 이제 하나의 ‘선호’ 문제가 되었다. 이는 대서양 양쪽에서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출생 직전까지도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료 결정’으로 낙태를 재규정하려는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은 본질적으로 “하지 말라”의 종교가 아니다.
가톨릭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의해 신앙과 선행이 촉구되는 종교다. 그럼에도 “하지 말라”가 자리할 곳은 있다. 인간 생명이 값싸게 여겨지고, 제거해야 할 불편함이나 예정된 시점에 내려놓을 짐으로 취급될 때,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생명·희망·가치·동등한 존엄성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소리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입장은 교회를 세속적 진보주의뿐 아니라, 탈기독교적 우파의 충동과 우선순위와도 대립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현대판 카이사르들에 대한 제자직으로 대체되고, 복음에 대한 충실성이 인종적 원한과 권위주의적 편의로 썩어 문드러진 세계관으로 바뀌는 곳에서는, 인간 생명의 거룩함이 설 자리가 없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한 활동가 살해를 보수 진영이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념적 반대자가 부상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 때 “FAFO(‘까불다 보면 그 대가를 치른다’)”를 얼마나 냉혹하게 외치는지를 보라. 이런 반응들은 생명을 경멸하는 것만큼이나 사랑(카리타스)이 결여된 태도다.
우파 진영이 닉 푸엔테스 같은 조롱 섞인 반유대주의자들이나, 특정 집단의 인종적 우월성 또는 열등성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파시스트들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편견들은 ‘임마고 데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신학과 양립할 수 없다. 그것들은 단지 非가톨릭적인 것이 아니라, 反가톨릭적이다.
물론 제프리 엡스타인이 인간 생명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경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가톨릭을 야만에 맞서는 방파제로 인식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생명 문제에서 교회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조급함을 느끼는 이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교회의 요구에 반기를 든다. 교만은 겸손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적임을 잘 알고 있다.
교회는 왜 인간 인격의 동등하고 불가침적인 존엄성을 믿는지 설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왜 그것을 믿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할 쪽은 세속 이데올로기들이다.
생명이 점점 더 소모 가능한 것이 되고, 그 도덕적 가치가 조건부가 되어 가는 이 시대에, 자율성·유용성·혈통이 하느님께서 주신 양도 불가능한 거룩함보다 우선시되는 탈기독교 윤리의 진격 앞에 맞서 서 있는 가톨릭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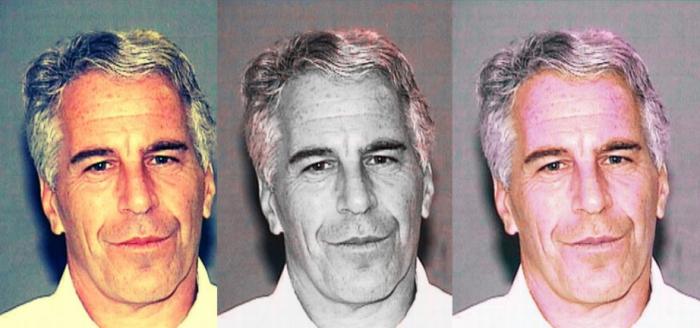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미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방대한 문서 묶음 속에는, 이른바 ‘유명 인사들의 성매매 알선자’로 지목된 엡스타인이 2013년에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 묻혀 있다.그 이메일에서 그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취하고 있는 자선 활동의 접근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엡스타인은 한 대화 상대에게 이렇게 불평한다.“저 사람들은 더 나은 재단 구조와 목표를 생각해낼 수 없는 건가.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터무니없는 선언이나 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 10억 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1달러씩만 식량을 주면 될 것 아닌가. 매년 10억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건 가톨릭의 최악의 모습이다.”이것을 일종의 ‘보증서’로 본다면, 교황청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바랄 수 없었을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빌 게이츠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 다만 그는 2014년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우리는 아이들을 종교적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아이들은 멀린다가 다니는 가톨릭 교회에 다녔고,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의 재단은 스스로를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에 따라 인도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분명 가톨릭 사회 교리를 떠올리게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2319항은 모든 인간 생명이 “살아 계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의지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가르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5년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인류를 “모두가 동일한 근본적 선, 곧 동등한 인격적 존엄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위대한 가족”이라고 묘사한다. 생명윤리 문제를 다룬 『생명의 기원과 존엄에 관한 훈령』에서, 당시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은 “인간 인격의 평등성, 존엄성, 그리고 근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경고했다.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온 ‘imago Dei 하느님의 형상’, 곧 브체렘 엘로힘(b’tzelem Elohim)의 교리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가톨릭 신앙을 반영한다. 그리고 종종 잊히지만, 이 영적 유사성은 우리가 삶의 방식에서 하느님을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이는 소속되어 있으며, 누구도 다른 이보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다.생명의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가톨릭을 오늘날 좌우 양쪽의 정치 윤리와 충돌하게 만든다. 진보 진영은 세계관을 ‘자율성의 극대화’라는 원리 위에 세운다. 그들에게 침해 불가능한 것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미덕·전통·사회적 관습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나 선호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며 살 권리다. 그래서 “내 몸은 내 선택”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자살은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죽음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재구성된다.엡스타인이 지적했듯이, 가톨릭은 생명의 불가침성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보 개념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된다. 20세기 중반 이후 교회는 서구 중도좌파 정치에서 주변화되었고, 대중문화에서는 생명에 대한 헌신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는, 교회를 세속적 현대성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이미 오래전에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과 선택을 다시 통제하려 드는 ‘하지 말라’는 기관으로 각인시켰다.생명 그 자체는 이제 하나의 ‘선호’ 문제가 되었다. 이는 대서양 양쪽에서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출생 직전까지도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료 결정’으로 낙태를 재규정하려는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은 본질적으로 “하지 말라”의 종교가 아니다.가톨릭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의해 신앙과 선행이 촉구되는 종교다. 그럼에도 “하지 말라”가 자리할 곳은 있다. 인간 생명이 값싸게 여겨지고, 제거해야 할 불편함이나 예정된 시점에 내려놓을 짐으로 취급될 때,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생명·희망·가치·동등한 존엄성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소리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이러한 입장은 교회를 세속적 진보주의뿐 아니라, 탈기독교적 우파의 충동과 우선순위와도 대립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현대판 카이사르들에 대한 제자직으로 대체되고, 복음에 대한 충실성이 인종적 원한과 권위주의적 편의로 썩어 문드러진 세계관으로 바뀌는 곳에서는, 인간 생명의 거룩함이 설 자리가 없다.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한 활동가 살해를 보수 진영이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념적 반대자가 부상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 때 “FAFO(‘까불다 보면 그 대가를 치른다’)”를 얼마나 냉혹하게 외치는지를 보라. 이런 반응들은 생명을 경멸하는 것만큼이나 사랑(카리타스)이 결여된 태도다.우파 진영이 닉 푸엔테스 같은 조롱 섞인 반유대주의자들이나, 특정 집단의 인종적 우월성 또는 열등성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파시스트들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편견들은 ‘임마고 데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신학과 양립할 수 없다. 그것들은 단지 非가톨릭적인 것이 아니라, 反가톨릭적이다.물론 제프리 엡스타인이 인간 생명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경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가톨릭을 야만에 맞서는 방파제로 인식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생명 문제에서 교회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조급함을 느끼는 이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교회의 요구에 반기를 든다. 교만은 겸손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적임을 잘 알고 있다.교회는 왜 인간 인격의 동등하고 불가침적인 존엄성을 믿는지 설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왜 그것을 믿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할 쪽은 세속 이데올로기들이다.생명이 점점 더 소모 가능한 것이 되고, 그 도덕적 가치가 조건부가 되어 가는 이 시대에, 자율성·유용성·혈통이 하느님께서 주신 양도 불가능한 거룩함보다 우선시되는 탈기독교 윤리의 진격 앞에 맞서 서 있는 가톨릭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미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방대한 문서 묶음 속에는, 이른바 ‘유명 인사들의 성매매 알선자’로 지목된 엡스타인이 2013년에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 묻혀 있다.그 이메일에서 그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취하고 있는 자선 활동의 접근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엡스타인은 한 대화 상대에게 이렇게 불평한다.“저 사람들은 더 나은 재단 구조와 목표를 생각해낼 수 없는 건가.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터무니없는 선언이나 하고 말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 10억 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1달러씩만 식량을 주면 될 것 아닌가. 매년 10억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건 가톨릭의 최악의 모습이다.”이것을 일종의 ‘보증서’로 본다면, 교황청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바랄 수 없었을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빌 게이츠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다. 다만 그는 2014년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우리는 아이들을 종교적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아이들은 멀린다가 다니는 가톨릭 교회에 다녔고,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의 재단은 스스로를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에 따라 인도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분명 가톨릭 사회 교리를 떠올리게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2319항은 모든 인간 생명이 “살아 계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의지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가르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5년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인류를 “모두가 동일한 근본적 선, 곧 동등한 인격적 존엄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위대한 가족”이라고 묘사한다. 생명윤리 문제를 다룬 『생명의 기원과 존엄에 관한 훈령』에서, 당시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은 “인간 인격의 평등성, 존엄성, 그리고 근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경고했다.유대교에서 전해 내려온 ‘imago Dei 하느님의 형상’, 곧 브체렘 엘로힘(b’tzelem Elohim)의 교리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는 가톨릭 신앙을 반영한다. 그리고 종종 잊히지만, 이 영적 유사성은 우리가 삶의 방식에서 하느님을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이는 소속되어 있으며, 누구도 다른 이보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다.생명의 보편적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헌신은, 가톨릭을 오늘날 좌우 양쪽의 정치 윤리와 충돌하게 만든다. 진보 진영은 세계관을 ‘자율성의 극대화’라는 원리 위에 세운다. 그들에게 침해 불가능한 것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미덕·전통·사회적 관습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나 선호를 최대한으로 실현하며 살 권리다. 그래서 “내 몸은 내 선택”이라는 구호가 등장하고, 자살은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죽음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재구성된다.엡스타인이 지적했듯이, 가톨릭은 생명의 불가침성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보 개념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된다. 20세기 중반 이후 교회는 서구 중도좌파 정치에서 주변화되었고, 대중문화에서는 생명에 대한 헌신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는, 교회를 세속적 현대성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이미 오래전에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의 삶과 선택을 다시 통제하려 드는 ‘하지 말라’는 기관으로 각인시켰다.생명 그 자체는 이제 하나의 ‘선호’ 문제가 되었다. 이는 대서양 양쪽에서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출생 직전까지도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료 결정’으로 낙태를 재규정하려는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은 본질적으로 “하지 말라”의 종교가 아니다.가톨릭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의해 신앙과 선행이 촉구되는 종교다. 그럼에도 “하지 말라”가 자리할 곳은 있다. 인간 생명이 값싸게 여겨지고, 제거해야 할 불편함이나 예정된 시점에 내려놓을 짐으로 취급될 때,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서 생명·희망·가치·동등한 존엄성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소리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이러한 입장은 교회를 세속적 진보주의뿐 아니라, 탈기독교적 우파의 충동과 우선순위와도 대립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현대판 카이사르들에 대한 제자직으로 대체되고, 복음에 대한 충실성이 인종적 원한과 권위주의적 편의로 썩어 문드러진 세계관으로 바뀌는 곳에서는, 인간 생명의 거룩함이 설 자리가 없다.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한 활동가 살해를 보수 진영이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념적 반대자가 부상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를 때 “FAFO(‘까불다 보면 그 대가를 치른다’)”를 얼마나 냉혹하게 외치는지를 보라. 이런 반응들은 생명을 경멸하는 것만큼이나 사랑(카리타스)이 결여된 태도다.우파 진영이 닉 푸엔테스 같은 조롱 섞인 반유대주의자들이나, 특정 집단의 인종적 우월성 또는 열등성을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파시스트들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편견들은 ‘임마고 데이’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신학과 양립할 수 없다. 그것들은 단지 非가톨릭적인 것이 아니라, 反가톨릭적이다.물론 제프리 엡스타인이 인간 생명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경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가톨릭을 야만에 맞서는 방파제로 인식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다. 생명 문제에서 교회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조급함을 느끼는 이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교회의 요구에 반기를 든다. 교만은 겸손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적임을 잘 알고 있다.교회는 왜 인간 인격의 동등하고 불가침적인 존엄성을 믿는지 설명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왜 그것을 믿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할 쪽은 세속 이데올로기들이다.생명이 점점 더 소모 가능한 것이 되고, 그 도덕적 가치가 조건부가 되어 가는 이 시대에, 자율성·유용성·혈통이 하느님께서 주신 양도 불가능한 거룩함보다 우선시되는 탈기독교 윤리의 진격 앞에 맞서 서 있는 가톨릭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리베르타임즈에서는 '미국 가톨릭 지성(First Things)'의 소식을 오피니언란에 연재합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편집위원실 -